안녕하세요.
"쉽고 재미있는 사주, 초코명리(초코서당)"의
에디터 초명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상담을 할 때 야자시/ 조자시를 전혀 사용하고 있지 있습니다. 그냥 자시가 되면 다음날로 일주가 바뀐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자시생인 경우,
내담자분들의 시주를 정확히 세우기 위해 1) 지역별 시차 2) 태어난 연도의 써머타임 도입 여부 3) 균시차를 모두 꼼꼼하게 살피고 있습니다.
또한, 자시의 경계에 걸쳐 태어난 분들은 해시(亥時)로도 시주를 세워 사주를 살핍니다.
개인적으로 야자시/조자시를 인정하지 않지만,
자시에 태어난 분들의 사주를 보다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 해시와의 경계도 고려하는 것입니다.
위에 언급한 내용들은 사주 해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를 줄이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야자시/ 조자시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다룬 바 있으니,
궁금하신 분은 아래 글이나 영상을 먼저 접하고 오시면 큰 도움이 될 듯합니다.
블로그: 야자시/ 조자시, 무엇이 문제인가? (1) - 기본편
오늘은 야자시/ 조자시 논란에 있어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리다는 주장을 하기 보다,
제가 몰랐던 부분에 대해 공부하는 마음으로 야자시/ 조자시에 대한 조금 심화된 내용을 풀어볼까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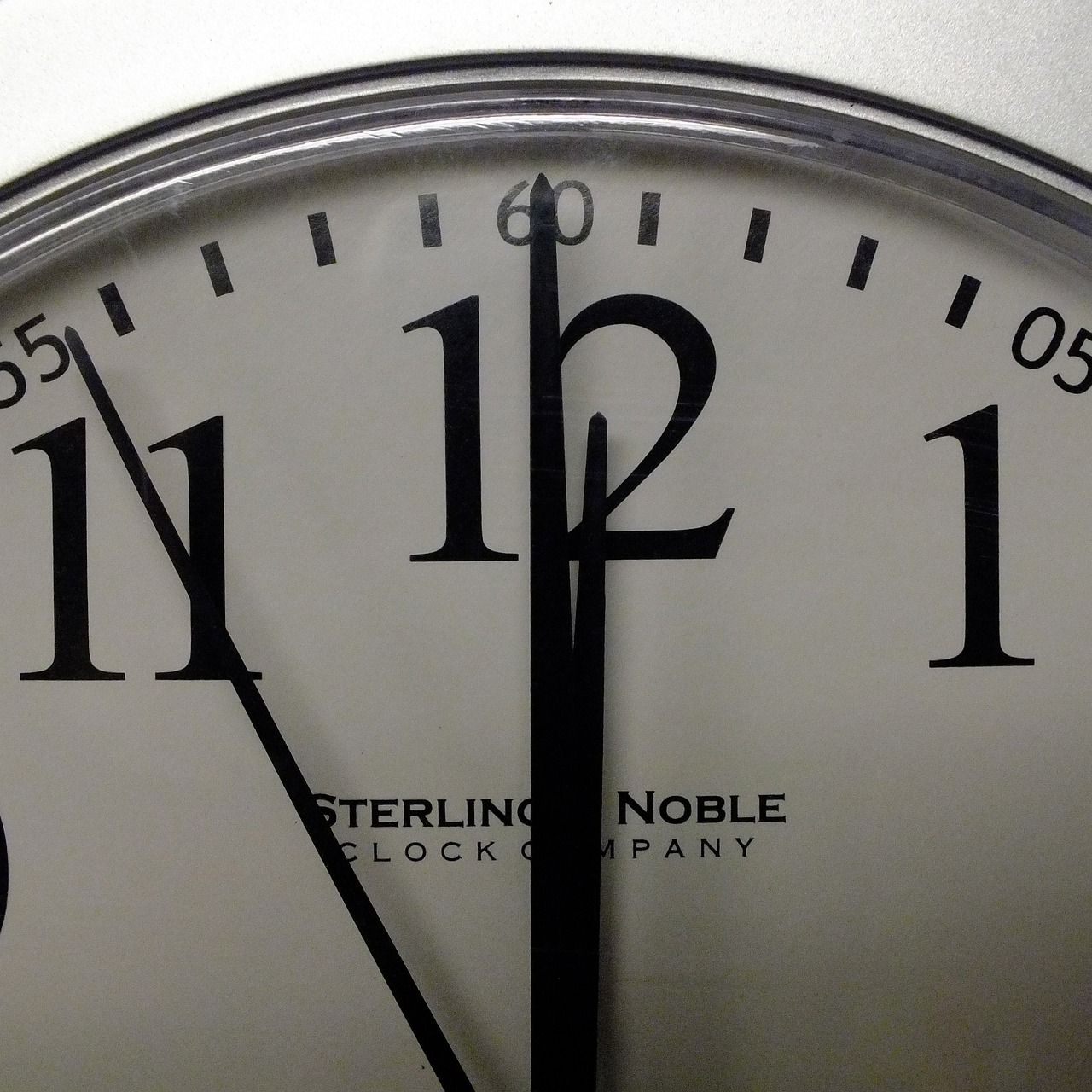
- 글의 순서 -
1. 들어가며
2. 고서로 살펴보는 야자시/조자시
3. 조선왕조실록의 기록
4. 조선에서는 왜 자시를 나누었을까(Feat: 자정/子正)
5. 야자시/ 조자시와 동지세수설/입춘세수설
6. 과거 천문에 관한 내용(Feat: 한국천문연구원)
7. 나아가며
많은 분들이 자정 00시를 기점으로 하루의 단위가 바뀌는 서양의 시간 체계가
오늘날 야자시/ 조자시 논란을 만들어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설명입니다. 가깝게는 조선에서도 야자시/ 조자시 개념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익히 알고 있듯, 자시는 밤 11시 부터 새벽 1시까지를 뜻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그 중간이 되는 밤 12시를 자정(子正), 야반(夜半), 야반자시(야반자시) 등으로 불렀습니다.
이는 자시의 반에 해당하는 시간 기준이 있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야반은 밤을 뜻하는 '야'와 한밤중을 뜻하는 '반'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아래와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 세종 19년(1437년) 기록에 ‘성구환’을 사용하는 법은 첫해 동지 첫날, 새벽 전 야반 자정을 시초로 하여
(用星晷環之術 。 初年冬至初日晨前 夜半子正 爲始...)...
여기서 신전(晨前)은 새벽 전을 뜻하고, 야반자정(夜半子正)은 자정을 뜻하는데요.
위 기록에 따르면, 당시 밤 11시부터 밤 12시에 해당되는 시간을 따로 표기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외 많은 기록에서, 조상들이 자시를 둘로 나누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나 분량 상 굳이 자료를 가져오진 않겠습니다 ^^;;)
실록에서 알 수 있듯 서양의 시간 체계가 들어온 것과 상관 없이, 조선에서는 이미 자시를 둘로 나누고 있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야자시/ 조자시 논란은 서양의 역법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조선에서는 밤 12부터 새벽 1시를 뭐라고 했을까?
한자문화권에서는 밤 12시부터 새벽 1시까지를 정자시(正子時), 주자시(晝子時), 명자시(明子時)로 표기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록에서는 이에 관한 표기가 되어 있지 않아, 해마다 역서를 발간하는 한국천문연구원에 대신 문의했더니, 밤 12시부터 새벽 1시를 자정시(子正時)라 불렀다 하더라구요.
자정은 또한 태양이 가장 남중하는 시간인 오정(午正) 낮 12시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밤 12시를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현대와 과거에 자시를 어떻게 불렀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시에 대한 명칭 비교
| 현재 | 조선왕조실록 | |
| 밤 11시 - 밤 12시 | 야자시 | 신전(晨前), 자초(子初) 초각 - 3각 |
| 밤 12시 | 자정 | 자정(子正), 야반(夜半), 야반자시 |
| 밤 12시 - 새벽 1시 | 조자시 | 자정(子正) 초각 - 3각 |
위 표를 보면 알 수 있듯, 현재와 과거에 자시를 어떻게 불렀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밤 11시 - 밤 12시는 자초(子初) 초각, 1각, 2각, 3각
밤 12시는 자정(子正)
밤 12시 - 새벽 1시도 자정(子正) 초각, 1각, 2각, 3각 으로 불렀습니다.
조선 시대에는 하루를 12시간으로 나누어 한자로 표기하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는 해자축(亥子丑), 인묘진(寅卯辰),
사오미(巳午未), 신유술(申酉戌) 시, 즉 12시진(時辰)이 그것이죠.
조선에서는 경점법(更點法)이라 하여,
하루를 12시진(地支)과 5경(更)으로 나누는 시간 체계를 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초(初)와 정(正)의 단위,
하루 24시간을 100각(刻)으로 나누던 방식 등에 대해 살펴보려 합니다.
초(初)와 정(正)은 하나의 시간을 앞과 뒤로 나누어 구분하는 용어입니다.
초(初)는 해당 시의 앞 부분인 첫 번째 1시간을,
정(正)은 해당시의 뒷 부분인 두 번째 1시간을 의미합니다.
조선시대에서의 1각은 대략 15분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자시를 예로 든다면 자시를 둘로 쪼갰을 때
앞 부분에 해당되는 시간을 자초(子初)로,
뒷 부분에 해당되는 시간을 자정(子正)이라 한다고 했잖아요?
이때 자초는 한 시간에 해당되고, 각은 이를 또 네 개로 나눈 단위가 됩니다.
밤 11시 00분 - 11시 15분까지를 자초 초각(初刻)
밤 11시 15분 - 11시 30분을 자초 1각
밤 11시 30분 - 11시 45분을 자초 2각
밤 11시 45분 - 밤 12시는 자초 3각이라 하는 것이죠.
새벽 01:00 - 03:00인 축시(丑時)도 역시 앞 부분에 해당하는 새벽 1시 - 새벽 2시는 축초로, 새벽 2시 - 새벽 3시는 축정으로 불렀습니다.
조선에서는 자시나 다른 시간들 모두 둘로 나누었고, 이를 또 각으로 더욱 세분화하였다는 뜻입니다.
2. 고서로 살펴보는 야자시/조자시
명리학에는 삼명통회, 연해자평, 적천수천미 등 여러 고전들이 있습니다.
서경대학교 송병섭 교수의 석사학위 논문 "자평명리학의 자시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야자시(夜子時)’라는 용어가 최초로 사용된 책은 명대(明代) 주기(周祈)의 『명의고(名義考)』 라고 합니다.
명리학을 공부하는 분들에게는 익히 알려진, 삼명통회의 논시각편에는 아래와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若子時, 則上半時在夜半前, 屬昨日,下半時在夜半後, 屬今日
만약 子時라면, 子時의 전반부는 夜半 前이면 어제에 속하고, 子時의 하반부는 夜半 後면 오늘에 속하니
기록에 따르면 자시를 상반시와 하반시로 나누고 있는데요.
자시의 전반부는 어제에 속하고,
자시의 하반부는 오늘에 속한다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자시/ 조자시를 인정하는 분들은 이 기록을 근거로,
자정 이후에 태어난 사람의 경우에 한해 일주를 다음날로 바꾸는 것이 옳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삼명통회에는 자시로 구성된 38여 개의 명조가 있는데,
이 중 야자시로 된 명조가 단 1개도 없습니다.
밤 11시 이후 자시가 되면,
그냥 다음날로 여겨 일주를 다음날의 일주로 바꾸었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삼명통회에는 야자시라는 용어도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연해자평에도 역시 야자시라는 용어는 없고,
자시로 구성된 37개의 명조 중에서 야자시를 적용한 명조가 단 1개도 없습니다.
임철초가 증주한 적천수천미에는 야자시라는 용어가 나오긴 하지만,
역시 자시로 구성된 30여 개의 명조 중에서는 야자시가 적용된 명조가 전혀 없습니다.
정리하면, 고전 중 삼명통회, 연해자평, 적천수천미에는 총 100여개가 넘는 자시 명조가 나오지만, 이 중 야자시가 적용된 사주가 단 한 개도 없다는 뜻입니다.
덧붙이면, 서락오가 1938년 저술한 자평수언에서 명리서로는 처음으로 야자시를 적용한 명조 1개를 3가지 예시를 들어 설명하고 있지만 자시로 구성된 15개의 명조 중에서 야자시를 적용한 명조는 역시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야자시를 주장한 분은 이석영 선생입니다. 그 분의 사주첩경에는 아래와 같은 글이 있죠.
야자시라 함은 밤11시에서 12시 사이의 시간을 말하는 것인데 정자시와 구별하는 것이다. […] 보편적으로 자시하면 그날 밤 11시에서 이튿날 오전 1시까지 사이를 말하는 것이오, 야자시는 밤 11시에서 그날 밤 12시(자정) 사이까지를 말하는 것이며, 정자시 는 밤 12시(0시)에서 새벽 1시까지를 말한다. […] 야자시생은 아 직 생일은 새 날을 세우지 않고 시간만 새 시간을 세우는 법이고 […] 정자시는 자정이 지난 관계로 다음날로 정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석영 선생은 사주첩경을 통해 야자시와 조자시를 구분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지만, 책에 있는 자시로 구성된 164개의 사주 중 야자시 명조는 단 2개 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 때문에, 이석영 선생께서 실제 간명 시 야자시를 적용하셨다고는 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나아가 박재완 선생과 이석영 선생이 야자시/조자시 문제를 매듭짓기 위해 만났다는 다른 기록도 살펴보겠습니다.
도계 박재완 선생의 제자이신 노석 류충엽 선생의 역학 에세이 <역문관야화>에 실린 에피소드입니다.
시간의 문제에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야자시(夜子 時)설이다. […] 이 이론은 언뜻 보기에는 그럴 듯하게 보이나 고 래(古來)의 12시를 현대에 24시로 분화하면서 생겨난 인위적인 이론이다. 언젠가 대전의 박재완 선생님과 서울의 이석영 선생님께서 이 문제를 매듭짓기 위해서 역문관에 오신 일이 있었다. 두 분께서는 한참을 토의하신 결과, 이것이 오행의 순환원리에 어 긋남과 고인(古人)의 문헌에서 찾아볼 수 없음을 지적하시고 정통 명리학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기로 합의하셨다.
대만의 명리학자 하건충의 팔자심리추명학에는 25개의 자시 명조가 있는데, 이 중 야자시 명조가 4개 등장합니다.
천고팔자비결총해에는 15개의 자시 명조가 있는데, 이 중 야자시 명조는 3개 뿐입니다.
위에 적은 글은 송병섭 선생님께서 서경대학교 석사학위 논문으로 이미 자세히 다루신 내용을 옮겨 적은 것인데요. 해당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아래 논문을 읽어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
자평명리학의 자시에 관한 연구, 서경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송병섭
https://www.dbpia.co.kr/pdf/cpViewer
3. 조선왕조실록의 기록
야자시/ 조자시를 써야한다고 주장하는 명리학자들의 경우, 대부분 아래와 같은 근거를 내세웁니다.
1) 조선왕조실록에도 야자시에 대한 여러 기록이 있다.
2) 이는 자시를 둘로 나누었다는 뜻으로, 야자시는 이전 날, 조자시를 다음날로 여겼다는 뜻이다.
2) 즉, 사주를 볼 때도 야자시는 전날로, 조자시는 다음날로 보아야 한다.
일단 조선왕조실록에 야자시에 대한 여러 기록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야자시에 대한 기록이 있다고 하여, 섣불리 야자시를 전날로 보고, 조자시를 다음날로 봐야한다는 뜻으로 여기시면 곤란합니다.
조선왕조실록에 야자시에 대한 기록이 여러번 나옴에도 불구하고,
야자시는 전날로 여기고, 조자시를 다음날 하루의 시작으로 여겼다는 부분이 명확하게 서술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선에서는 하루의 시작이 되는 기준을 과연 어디에 두고 있었는지,
실록만 보고는 알기가 어려웠습니다.
조선에서도 야자시를 썼기 때문에, 현대의 사주명리학자들도 반드시 야자시를 써야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근거로 내세우는 여러 기록 중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태조실록14권, 태조 7년 8월 26일 己巳 1번째기사에는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석주가 말하였다. "임금의 병환이 위독하므로 오늘 밤 자시(子時)에 병을 피하여 서쪽 작은 양정(涼亭)으로 거처를 옮기고자 한다." 이에 여러 승지들이 모두 근정문(勤政門)으로 나아갔다.
"石柱曰: 上疾篤, 今夜子時, 欲避病于西小涼亭。" 於是, 諸承旨俱詣勤政門
원문을 보면, '今夜子時'를 '즉야자시'라고 읽는데, 야자시 직전이라는 뜻으로도 볼 수 있고, 오늘밤 자시라는 뜻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위 문장의 '今夜子時'를 오늘 밤 자시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태조 7년 8월 26일, 즉 음력 1398년 8월 26일은 기사일이었습니다.
여기서 논란이 되는 것은,
1) 8월 26일 기사일 밤 11시에 태조의 거처를 옮기려 하였는가,
2) 8월 26일 기사일 밤 11시와 가까운 이전 시간에 태조의 거처를 옮기려 하였는가,
3) 8월 27일 경오일 새벽 1시 이전에 태조의 거처를 옮기려 하였는가, 입니다.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실록의 저 기록을 두고, 오늘밤 자시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야자시를 쓰는 분들은 실록의 저 시간이 "내일 밤 자시"가 아니라 "오늘 밤 자시"라 말했다고 보아야하기 때문에,
야자시도 여전히 다음날이 아니라 이전날로 봐야한다고 주장합니다.
태조실록 14권 태조 7년 8월 26년 기사일의 첫번째 사료는 태조 7년 1398년에 발생한 제 1차 왕자의 난에 대한 기록입니다.
정도전, 남은, 심효생 등이 어린 세자인 이방석의 측근을 결집하고, 정안군(이방원) 등의 왕자들을 제거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이를 알아챈 이방원이 이숙번 등과 함께 반격을 준비했고, 기사일(7월 26일) 밤, 이방원이 군사를 모아 정도전, 남은, 심효생 등을 제거한 사건이지요.
태조는 이미 병환이 깊었던 지라 큰 충격을 받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위 사료의 '今夜子時''를 아래 1번, 2번처럼 해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1) 8월 26일 기사일 밤 11시에 태조의 거처를 옮기려 하였다.
2) 8월 26일 기사일 밤 11시가 가까워지는 시간에 태조의 거처를 옮기려 하였다.
나아가 국사편찬위에서는 사람들이 헷갈려할 수 있으므로, 관례에 따라 위 부분을 오늘밤 자시라고 변역한 것일까요? 이 부분을 알기 위해 조선사를 전공한 역사학 교수나 역사학회 등 몇 곳에 문의를 해봤지만 답변을 받지 못해 명확히 알기가 어려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에 답변을 받는대로, 새로운 내용을 업데이트하겠습니다.
사주명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는 저처럼 밤 11시가 지나면 일주(날짜의 기운)가 바뀐다고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언가를 기록할 때는 당일 밤 11시가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오늘 밤 자시'라고 기록할 듯 합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시간을 이야기할 때와도 비슷한데요.
예를 들어, 밤 11시가 지나 자시(子時)에 접어들더라도 여전히 "오늘 밤 자시"라고 표현하지, "내일 밤 자시"라고 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기록도 살펴보겠습니다.
영조실록2권, 영조 즉위년 12월 4일 癸酉 2번째기사
황해 감사(黃海監司)가 장계(狀啓)하기를, "장연 부사(長淵府使) 김협(金浹)의 첩정(牒呈) 에 ‘11월 22일 밤 자시(子時)에 뇌성(雷聲)이 크게 일어났다.’고 하였습니다."
○黃海監司狀啓, 長淵府使金浹牒呈, 十一月二十二日, 夜子時, 雷聲大作。
위 인용문에 나오는 음력 1724년 11월 22일은 갑진년, 정축월, 임술일에 해당합니다.
야자시/ 조자시를 쓰는 분들 중에서는 특히 이 부분을 거론하며,
조선에서도 하루의 시작을 자정으로 봤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역학동에서도 관련된 글이 올라오기도 했는데요.
(위 링크 참조)
관련된 글들에 따르면, 조선왕조실록에서는 야자시에 뇌성이 크게 울린 날을 야자시를 적용하여(다음날이 아니라, 전날로 여겨) 임술일로 기록했기 때문에, 하루의 시작을 자정 이후로 봐야 한다(즉 야자시/조자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로 위 실록의 기록처럼,
음력 1724년 11월 22일은 갑진년, 정축월, 임술일이 맞습니다.
야자시/ 조자시를 주장하는 많은 분들은 뇌성이 울린 시간이 1724년 11월 22일 자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날은 임술일이므로 조선시대에는 야자시를 다음날로 여기지 않았다고 여깁니다.
11월 22일 임술일의 사료에는, 뇌성과 관련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정확한 시간을 알길이 없으니, 단순히 이 기록을 관원들이 야자시를 사용했다는 증거로 내세우는 것은 조금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뇌성이 울린 시간이 1724년 11월 21일 밤 11시 부터 22일 새벽 1시 이전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신유일인 21일 밤 11시, 즉 자시 이후가 되어도 22일 임술일 자시가 되니까요.
저는 번개가 친 시간을
11월 21일 신유일 밤 11시 - 11월 22일 임술일 새벽 1시 사이로 해석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조선에서도 자시를 둘로 나누고, 이전 자시는 신전시로 기록했습니다만,
저 기록은 그냥 자시에 뇌성이 울렸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비추어 보면,
11월 22일 임술일 새벽 1시 이전에 번개가 쳤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4. 조선에서는 왜 자시를 나누었을까(Feat: 자정/子正)
조금 머리가 아프더라도,
하나의 기록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조실록53권, 정조 24년 1월 12일 乙丑 6번째기사
관상감이 청력과 어긋나는 것을 우리 나라 역서에 따라 시행할 것을 건의하다
9월 중기(中氣)의 상강(霜降)의 경우 청나라는 9월 초6일 밤 자시(子時) 3각 6분에 들고, 우리 나라는 초7일 자정(子正) 2각 3분에 들어 하루의 차이가 납니다.
九月中氣霜降, 淸爲九月初六日夜子時三刻六分, 鄕爲初七日字正二刻三分, 差以一日。
을축일 여섯번째 기사 중 많은 부분을 생략하고,
위 부분만 가지고 와보았습니다.
정조실록53권, 정조 24년 1월 12일 乙丑 6번째기사는 "조선과 청나라의 역법이 대부분 일치하지만, 일부 절기의 시작 시간이 조금 다르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조선은 자체 역서를 따르는 것이 바람집하다는 내용으로 마무리되죠.
조금 뜬금없지만, 조선은 청나라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청나라의 시간을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선은 자체적인 역서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위 실록에 대한 전문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정조실록53권, 정조 24년 1월 12일 乙丑 6번째기사
위 기록을 통해,
우리는 조선에서는 자시 가운데 자정을 맞추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문화권에서는 태양의 위치를 기준으로 시간을 정했습니다.
태양이 남중하는 시각을 정오(正午)라고 하였고,
그 반대 지점을 하루의 시작으로 삼아 자정(子正)이라 하였습니다.
동양 문화권에서도 이러한 개념이 자연스럽게 적용되었습니다.
같은 자시라도 이전의 자시는(야자시) 전날에 속하고,
이후의 자시(조자시)는 다음날의 날짜에 해당되기 때문에 자정이라는 개념을 만들었다고 보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것보다 자정은 정오와 대비되는 시간으로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개념으로 보아야 합니다.
5. 야자시/ 조자시와 동지세수설/입춘세수설
잠깐, 아래 실록의 기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실록49권, 세종 12년 7월 7일 을사 3번째기사
이는 곧 음양을 각기 극한에 이르게 하여 그 절목(節目)의 분별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밤과 낮에 비유한다면 오정(午正)이 아니면 양(陽)의 극(極)이 아니며, 자정(子正)이 아니면 음(陰)의 극이 아닌 것입니다.
以助其陰陽之盛, 是乃陰陽各致其極處, 以成其節目之別者也。 比之晝夜, 非午正, 非陽之極; 非子正, 非陰之極,
세종 12년 7월 7일 을사년 3번째 기사 중 많은 부분을 생략하고, 위 부분만 가지고 와보았습니다.
이 기록에 따르면, 오정(午正)을 양의 기운이 극단에 이른 시점으로,
자정을 음의 기운이 극단에 이른 시점으로 여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예로부터, 자시를 만물이 시작되고, 소생(蘇生)하며, 탄생하는 시간으로 여겼습니다.
그 기운의 극단이 바로 자정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래 두 가지로 학자들의 의견이 나뉩니다.
1) 자시가 되면 다음날로 바뀐다
- 야자시/조자시를 인정하지 않음
2) 자시의 기운이 더욱 극에 이른 자정에 이르러야 다음날로 바뀐다
- 야자시/ 조자시를 인정하며 적극 활용함
사실 깊이 들어가면 이 같은 야자시/조자시 논란은 동지세수설/ 입춘세수설에 대한 논란과 맞닿아있습니다.
동지세수설은 동지(冬至)를 한 해의 시작으로 보는 관점이고,
입춘세수설은 입춘(立春)을 한 해의 시작으로 보는 관점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 포스팅에서 자세히 다룬 바 있으니,
관심있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확인 바랍니다.
입춘세수설 VS 동지세수설, 무엇이 맞는 걸까?
안녕하세요. "쉽고 재밌는 사주, 초코명리"의에디터 이명관입니다. 오늘은 사주명리학계의 영원한 난제 중 하나인,입춘세수설과 동지세수설에 대해 자세히 풀어볼까 합니다. - 글의 순서-
wany26.tistory.com
저는 철학적(이론적)으로는 자월(子月) 동지에 새해가 시작된다고 할 수 있지만,
하늘과 땅 사이의 시간적, 공간적 왜곡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인월(寅月) 입춘이 되어야 한해가 진정한 새해가 시작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하루를 기준으로 보면, 자시에 다음날이 시작된다고 봅니다.
읽는 분들에 따라서는 어쩌면 두 입장에 큰 모순이 있다고 느끼실 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월이 아니라, 인월에 한 해가 시작된다고 여긴다면,
자시에 하루가 시작된다고 여기는 것은 잘못된 관점이 아니냐고 여기는 것이죠.
저는 연(年)과 월(月)의 단위로 볼 때 시간적, 공간적 왜곡이 아주 크지만,
하루(日)를 단위로 했을 때는 그 왜곡이 그리 크지 않아,
실질적으로도 자시가 되면 다음날로 기운이 바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껏 소개해드린 야자시/조자시 논란을 넘어,
자시나 자정, 축시(丑)가 아니라, 인시(寅)가 되어야 하루가 시작된다고 보는 (극)소수의견도 존재합니다.
인월이 되어야 새해가 시작된다고 보기 때문에,
하루의 시작 단위 역시 인시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6. 과거 천문에 관한 내용(Feat: 한국천문연구원)
재미있게도 한국천문연구원에 문의하고 답변 받은 내용에 따르면,
과거 하늘과 천체의 움직임에 관한 기록들의 경우 자시는 물론, 축시, 인시에 일어난 일들도 모두 한 날짜에 적혀있다고 합니다.
명리학에서 자시가 되면 다음날로 날짜가 바뀐다고 보는 것과 달리,
조선시대 천체 기록의 경우 해시, 자시, 축시의 천체현상이 쭉 한 날짜에 이어서 서술되어 있다는 것이죠.
적어도 야자시/ 조자시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자정 12시가 넘어가면 다음날로 바뀌어야 하는데 전날짜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은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천문에 관한 것은 대부분 초저녁이 되어야 관측이 가능하고,
밤새 기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쭉 이어져서 기록이 된 건 아닌가 싶었습니다.
조선시대의 날짜 변환에 대한 부분은 정확히 알기 어렵지만,
적어도 천문 기록에 관한 부분은 그렇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갑자일의 기록이 있다, 고 하면
갑자일의 유시, 술시, 해시, 자시, 축시가 시간 순으로 쭉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어쩌면 조선왕조실록의 경우에도,
자시가 되면 다음날로 날짜를 바꾸어야하지만,
사관이 사건의 맥락과 연결성을 고려하여 새로운 날로 넘기지 않고 표기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7. 나아가며
야자시/ 조자시 논란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조선왕조실록에 왕의 탄생날짜는 기록되어 있지만(ex. 세종대왕, 숙종, 정조 등) 정확한 출생시간에 대해서 만큼은 제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왕이라는 직위가 한나라의 국가를 경영하는 자리였던 만큼, 왕의 사주가 전부 알려지면 명나라와의 외교 관계나 국운의 길흉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일부러 감추어진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어쩌면 왕의 탄생 시간도 실록에 기록이 되고, 그 중에 자시에 해당되는 사주가 하나라도 있었다면 야자시/조자시에 대한 논란은 불거지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네요.
천문학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자정을 하루의 분계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하지만 동양의 사상적 근간인 ‘천개어자(天開於子)⋅지벽어축(地闢於丑)⋅인생어인(人生於寅)', 즉 “하늘은 자시에 열리고, 땅은 축시에 움직이고, 사람은 인시에 일어난다.”는 관점으로 보면 동아시아 문화권에서는 자시를 기점으로 새로운 날이 시작된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겠죠.
물론, 하늘이 자시에 열린다는 관점에 따르면,
새해 역시 인월(寅月)이 아니라 자월(子月)에 시작된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지 않은가, 반문할 수도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상담 시 야자시/조자시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새해의 시작은 자월 동지가 아닌, 입춘이라고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자료를 찾아볼 수록 이 문제가 참으로 간단치 않다는 생각이 강하게 드네요.
학자에 따라 야자시/조자시 논란에 대한 자신만의 입장을 강하게 견지할 수는 있겠지만,
이에 대해 쉽게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최근 야자시/조자시와 관련된 글을 쓰기 위해 여러 논문을 살펴봤는데요.
개인적으로 가장 이 문제에 대해 깊이있게 서술된 논문이 두 가지라고 봅니다.
1. 명리학에서 시간(時間)에 관한 논점 고찰-자시(子時)를 중심으로, 김만태, 신동현
→ http://namestory.dsso.kr/bbs/board.php?bo_table=sub3_1&wr_id=75&page=0&page=0
2. 자평명리학의 자시에 관한 연구, 서경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송병섭
→ https://www.dbpia.co.kr/pdf/cpViewer
특히 1)번 논문의 경우, 아래처럼
"천문학적 관점에서는 야자시설이 보다 타당하다. 그러나 명리학에서 채용하고 있는 간지력법(干支曆法)은 천문학적 의미보다는 점성술적 의미가 더 강하다. 그리고 한 해의 시작인 세수(歲首)도 초입절(初入節)을 분계로 한다. 이런 점 등을 고려할 때 자시 초각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다는 정자시설이 명리학적 입장에 보다 부합된다."
라고 논문을 끝맺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논문의 저자가 상당부분 모두 고서에서 야자시/조자시와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바라봤는가에 대해 깊이있게 고찰하고 있다 보니, 야자시/조자시 논란에 대한 섣부른 결론이라는 생각은 전혀 들진 않습니다.
덧붙이면 대체적으로 야자시/조자시와 관련된 논의를 진행할 때, 많은 분들이
1) "내가 오랫동안 사주를 봤더니 야자시/조자시를 적용하는 게 맞더라"
2) "무슨 소리냐! 내가 사주를 봤을 때는 자시가 되면 무조건 다음날로 바뀌더라"
같은 두 가지 주장을 합니다.
이는 큰 의미가 없는 주장입니다. 통계적 분석이 큰 의미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죠.
한 사람의 인생은 사주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 특수관계인, 개인의 선택과 경험 등 여러 요인에 영향을 받기 마련입니다.
한정된 사주 데이터를 가지고 통계적으로 분석해서, 야자시/조자시를 적용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중 어떤 것이 당사자의 삶과 더 부합하는지를 따지는 것은 여러 논란을 낳을 수 있습니다. 삶에는 여러 요인이 작용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배제하고, 당사자의 삶이 달라진 이유가 단순히 시간의 차이 때문인지를 먼저 입증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야자시/ 조자시와 관련해서는 각각의 논리 모두 오랜 연구와 학자들의 견해 속에서 나름의 타당성이 강조되어 왔습니다. 야자시와 조자시에 대한 논의가 여전히 진행 중인 까닭에, 앞으로도 더 많은 연구과 검증이 필요할 것입니다.
사주명리학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단순히 내가 살펴봤더니 맞더라, 틀리다 식의 논쟁을 넘어, 야자시/조자시와 관련된 더욱 체계적인 연구와 실증적인 접근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명리학이 더욱 깊이있는 학문으로 자리잡기를 바라며,
부족하지만 야자시/조자시와 관련된 오늘의 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지금까지,
"쉽고 재미있는 사주, 초코명리"의
에디터 초명이었습니다.
☑️초코서당 2기 기본과정 중급반 안내문(25.04.08 개강)
→ https://wany26.tistory.com/75
☑️1기 전문가 과정 통변반 안내문(25.04.03개강)
→ https://wany26.tistory.com/76
☑️ 책 '명리, 나를 지키는 무기 : 시리즈 도서출판 멀리깊이
본인의 사주를 제대로 해석해보고 싶으신 분, 언젠가 명리를 전문적(상담가, 연구자, 강사)으로 활용해보고 싶은 분들에게 책을 소개하려 합니다.
유튜브를 통해 사주명리를 공부하신 분들은 천간, 지지, 십성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지만, 막상 원국과 대세운의 합과 충과 형의 작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내 사주의 용신을 어떻게 추출하고, 대세운에 따라 언제 내가 나아가고 물러가야 하는지를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에 언급한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나아가 내 사주도 제대로 통변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명리, 나를 지키는 무기(기본+중급+심화편 세트) - 예스24
이 상품은 YES24에서 구성한 상품입니다.(낱개 반품 불가).[도서] 명리, 나를 지키는 무기 (기본편)명리공동체 ‘철공소’ 강연 확정! 강헌, 현묘 강력 추천!고리타분한 팔자타령을 뛰어넘는 젊은
www.yes24.com
☑️초코명리와 함께 선을 쌓고, 함께 좋은 일을 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초코명리는 후원금을 모아 결식아동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작은 정성이나마 모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후원내역과 기부명세서는 유튜브 영상을 통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초코명리' 후원 계좌: 카카오뱅크 3333-28-5522125 (나*완)
*기부에 동참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안내 입니다.
초코명리(초코서당) 후원 방법 안내(Feat: 꿈베이커리)
안녕하세요. "쉽고 재밌는 사주, 초코명리(초코서당)"의에디터 초명입니다. 오늘은 초코명리(초코서당)의 후원과 관련된 글을 포스팅하려 합니다. 1. 들어가며(함께 기부금을 모으게 된 이
wany26.tistory.com
'사주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야자시/ 조자시에 대한 모든 것 (1) - 기본편 (1) | 2025.03.03 |
|---|---|
| 입춘세수설 VS 동지세수설, 무엇이 맞는 걸까? (4) | 2025.02.20 |
| 내 운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방법! (0) | 2023.12.30 |
| 윤석렬 손바닥 왕(王)자 사용법과 주술적 의미 (3) | 2021.10.06 |
| 신문에 적힌 오늘의 운세는 왜 안맞을까? (0) | 2021.10.01 |